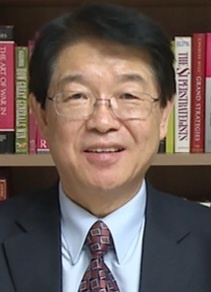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열었다. 북한 제재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는 미국 등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안보리 비(非)이사국인 한국과 북한은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회의 소집 근거는 북한이 ICBM 발사를 금지한 9개의 UN 결의안을 뻔뻔스레 위반한 데 있었다. 북한은 24일 오전 3시 50분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군사 정찰위성’ 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우기지만, 역시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발사 장치임은 의심할 바 없다.
이번 사건이 국제정치학적으로 의미있는 이유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9개의 유엔결의안이 모두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이다. 그런데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을 제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러시아와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이상 유엔은 사실상 어떤 결의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북한 미사일과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엔은 무용지물에 불과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유명무실한 UN을 해체하자는 사람과 침략국인 러·중·북 3국을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자는 주장도 있을 정도다.
국제정치가 힘의 정치(Power Politics)의 영역임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하지만 21세기의 갈등 구조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세계의 부랑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주적들을 순서대로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이라고 설정한 바 있다. 이들 나라들은 독재체제라는 특징을 공유하며 자유세계와 사사건건 대결한다. 이 4개국이 모두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기에, 미국 학자들은 이들을 유라시아 독재국가(Eurasian Dictatorships)라고 칭한다. 이 가운데 3국이 지정학적으로나 정치사상적으로 대한민국과 직접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인도·호주 등 자유진영과 같은 편이 돼야 한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이후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자유진영 편에 확실하게 줄을 섬으로써 유라시아 4대 독재국가의 궁극적 패망은 확정됐다. 동시에 자유통일의 길도 활짝 열리게 됐다.

